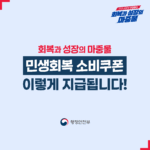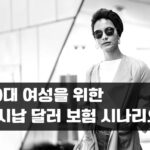회사 동료 김 과장은 올해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대화가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죠.
“아들아, 내가 젊었을 때 짜장면이 100원이었어. 지금은 8,000원이지. 그런데 월급은 몇 배나 올랐을까? 그때 내 월급이 8만원에서 지금 너는 300만원. 겨우 37배인데 짜장면 값은 80배 올랐어.”
이 말을 듣고 김 과장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번 돈이 진짜 돈일까? 아니면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
🥇 할아버지의 금반지가 알려준 진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야기하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금반지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걸 할아버지가 2000년에 28만원 주고 사셨단다.”
스마트폰으로 현재 금 시세를 검색해보니 335만원이었습니다. 25년 만에 12배나 올랐죠.
| 연도 | 금 1온스 가격 | 주식 수익률 비교 |
|---|---|---|
| 2000년 | 280달러 | – |
| 2025년 | 3,350달러 | – |
| 상승률 | 12배 | S&P 500: 6.6배, 나스닥: 4-5배 |
“이상하다… 금이 주식보다 2배나 더 올랐네?”
김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 중 상당 부분이 ‘돈의 가치 하락’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 뉴스에서 본 충격적인 숫자들
다음 날 경제 뉴스를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 국가 | 통화량 증가율 | 경제성장률 | 비율 |
|---|---|---|---|
| 미국 | 42.4% | 41.8% | 1.01배 (균형) |
| 한국 | 40.1% | 5.9% | 6.73배 (불균형) |
미국은 경제가 40% 성장하면서 돈도 40% 늘린 반면, 한국은 경제가 6%만 성장했는데 돈은 40%나 늘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올해 상황이었어요.
| 구분 | 2025년 성과 |
|---|---|
| 경제 성장률 | 1% 미만 (KDI 0.8%, OECD 1.5%) |
| 코스피 상승률 | 27% (상반기) |
경제는 거의 안 자라는데 주식만 하늘 높이 올랐더군요.
🛒 마트에서 느낀 변화
주말에 아내와 마트에 갔는데,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15만원이던 장보기가 18만원이 됐거든요.
“라면도 오르고, 과자도 오르고…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잖아.”
김 과장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키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1년에 물가가 80%나 올랐다는 뉴스가 생각났거든요.
💡 화폐 분산의 필요성
경제학과 후배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형. 원화만 갖고 있지 말고 여러 나라 화폐로 나눠서 보관해야 해요. 특히 달러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축통화거든요.”
“왜 달러가?”
“달러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59%를 차지하고, 국제무역의 88%가 달러로 결제돼요. 더 중요한 건 미국은 경제성장률과 통화증가율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에 비해 과도하게 통화를 늘리지 않았다는 거죠.”
후배가 제안한 자산 구성은 이랬습니다.
| 자산 종류 | 권장 비중 | 이유 |
|---|---|---|
| 기축통화(달러 등) | 30-40% | 화폐 안정성 |
| 해외 자산 | 20-30% | 글로벌 분산 |
| 실물 자산 | 20-30% | 인플레이션 대비 |
| 귀금속(골드) | 10-20% | 가치저장 수단 |
“형, 중요한 건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통화량이 경제성장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 생각해 볼 점들
김 과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경제성장 대비 6.7배나 많은 통화를 공급했죠.
둘째, 이런 상황에서 원화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터키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화가치 하락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셋째, 화폐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의 통화로만 보유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기축통화와 실물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할아버지 금반지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